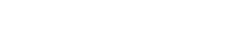Archives
그는 삶이란 ‘산’을 숨 가쁘게 오르내렸다
2023.07.26.I조선일보
[다시 보다: 한국근현대미술전] [지금 이 명화] [8] 유영국 ‘산’
김별아 소설가
‘산’이라는 한 음절은 산을 담기에 너무 짧다. ‘삶’이라는 단어 또한 삶을 담기엔 간소하다. 그러나 산을 오르내리고 삶의 곡절을 겪고 나면 결국 산은 산이고 삶은 삶일 수밖에 없는 간명한 진리에 감복한다. 복잡할수록 단순해진다. 고단할수록 선명해진다.
“한국 추상미술의 선구자”로 일컬어지는 유영국(1916~2002)의 ‘산’(1966년작)은 가장 구체적인 추상의 아름다움을 보여준다. 난해하고 모호하다는, 추상에 대한 오래된 오해와 편견은 유영국이 생전에 했던 말로 갈음한다. “추상은 말이 필요 없다. 설명이 필요 없다. 보는 사람이 보는 대로 이해하면 된다.”
유영국이 평생을 두고 천착했던 산은 삶의 시원(始原)이다. 1916년 강원도(현재 경북) 울진에서 태어난 그에게 고향의 높고 웅숭깊은 산은 압도적인 자연의 원형으로 영혼의 마디마다 새겨진다. 해상 상업으로 치부한 집안 출신으로서 후미진 벽촌에서 경성 제2고보를 거쳐 도쿄 문화학원 유학생이 되었고, 추상적이고 전위적인 자유미술가협회상을 수상하며 활동한다. 해방 후 귀국하여 가업을 이었던 유영국 개인의 삶은, 급경사의 험산 같은 한국 현대사를 통과하며 생업과 예술의 오르막과 내리막을 숨 가쁘게 오간다. 고향과 가족은 힘이면서 짐이었다. 귀국 후 10년 동안 붓을 꺾었던 시간은 스스로를 몰아치게 만드는 공백의 공포이기도 했다.
‘문제적 인간’임에 분명한 유영국은 중간이 없는 캐릭터다. 1964년 첫 개인전을 열면서 그룹 활동의 시대는 끝났다고 선언하기 전까지는 현대미술운동에 자신을 돌보지 않고 내던졌고, 개인의 작업실로 돌아간 후로는 심장 박동기를 부착한 채로 내일이 없는 것처럼 작품에 매달렸다. “60세까지는 기초 공부”를 한다며 정해진 일상의 시간표에 맞춰 “기계같이” 그림을 그렸다. 그 타협 없는 숨 가쁜 날들이, 바위에 구멍을 뚫는 듯한 집중과 몰입이 강렬하지만 편안한 ‘균형과 하모니’의 색채로 ‘산’에 표현되어 있다. 산은 다정한 듯 가혹하다. 고독한 정상과 비밀의 골짜기가 숨어 있고 변화무쌍한 날씨에 시시때때로 낯빛이 달라진다. 그 자체가 예측할 수 없는 인간의 삶과 같아서, 사람들은 삶을 닮은 산에 간다. 추상은 수많은 해석을 낳기 마련이지만, 1960년 8월 23일 자 ‘조선일보’에 그림과 함께 “화제(畵題)-산”에 대해 기고한 유영국의 글은 의외로 소박하다. “내가 산을 좋아하는 것도 아마 산 고장에서 자란 탓일 게다. 내가 자란 마을에서 평탄한 길을 걸어 산모퉁이 하나를 돌아가면 끝없는 바다였다 바다를 둘러싸고 첩첩이 헐벗은 산과 웃 입은 산들이 보였다.”
작품 보려면…▲서울 소마미술관 8월 27일까지 ▲입장료: 성인 1만5000원, 학생 9000원 ▲문의: (02)724-6017
*기사 다시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