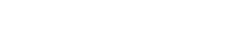Archives
[문향만리] 산 -유영국 / 박송애
2024.01.25.I대구일보
프레임에 갇힌 산 툭툭 불거진다/강렬한 색채로 막아버린 숲 소리/헤매다/내 안에 머문/산 안의 산 산 밖의 산//바람 한 점 없는 산 저 혼자 흔들리고/달빛 닿은 산 그리매 바다에 다다르면/부순다/색채를 허물고/누군가 들어간다
「정음시조5」(2023, 정음시조문학상운영위원회)
‘산’은 유영국(1916∼2002)의 그림을 보고 강렬한 느낌을 받아 두 수의 시조로 쓴 것이다. 화가 유영국의 작품 세계는 색채가 가장 눈에 띈다. 그는 그림에서 제일 중요한 요소를 색으로 보고 색을 면으로 확장하는 작업에 몰두했다. 이른바 색면 추상이다. 수화 김환기와 더불어 강렬한 구성으로 캔버스를 채운 한국추상미술의 선구자다.
화자는 프레임에 갇힌 산 툭툭 불거진다, 라고 인상적인 첫 줄로 유영국의 그림 세계로 이끌어 들인다. 그리고 대상에 대해 강렬한 색채로 막아버린 숲 소리, 라는 미학적 해석을 들려준다. 숲 소리를 보고 들을 수 있어야 하는데, 그걸 강렬한 색채가 차단해 버렸으니 난감하다는 표현인 셈이다. 그렇기에 화자는 헤맨 것이다. 오랫동안 헤맨 것이다. 그러다가 보니 내 안에 머문 산 안의 산 산 밖의 산을 알아차린 것이다. 놀라운 일이다. 선적 경지와 같은 대목이기도 하다.
시인들이 이따금 그림을 보고 시를 쓰고자 하는 충동이 일어날 때가 있다. ‘산’도 마찬가지 경우일 것이다. 그림 속에 시가 있고 시 속에 그림이 있기에 아름다운 그림과 문득 맞닥뜨릴 때 어떤 느낌이 와서 글을 쓰게 되는 것이다. 다음으로 화자는 바람 한 점 없는 산을 본다. 그 산은 저 혼자 흔들리고 있다고 표현한다. 이어서 달빛 닿은 산 그리매 바다에 다다르면 부순다, 라고 별안간 파괴적인 언사 끝에 색채를 허물고 누군가 들어간다고 진술한다. 창조된 세계를 부수어 버린 다음 잘 형상화된 색채를 허물고 알 수 없는 한 존재가 그 속으로 들어간 것이다. 화자와 그림 세계가 하나가 되는 순간이다.
그림을 두고 시를 쓰는 일은 무척 어렵다. 자칫하면 변죽을 울리다 말거나 가벼운 스케치에 머물 수가 있다. 그러나 박송애 시인은 박영국의 색면추상 ‘산’을 개성적인 시각으로 재해석하여 고뇌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한 사람의 인생행로를 역동적으로 육화해 보인다.
그림 속으로 들어가는 경지에까지 이르는 감상을 극치라고 불러도 좋겠다. 전시회를 찾아 그림 앞에 서는 일이 일상에서 얼마나 귀한 것인지 ‘산’은 잘 말해주고 있다. 좋은 그림을 다수 감상하고 돌아오면서 나도 그림을 한번 그려보았으면 하던 때가 떠오른다.
이정환(시조 시인)
*기사 다시보기